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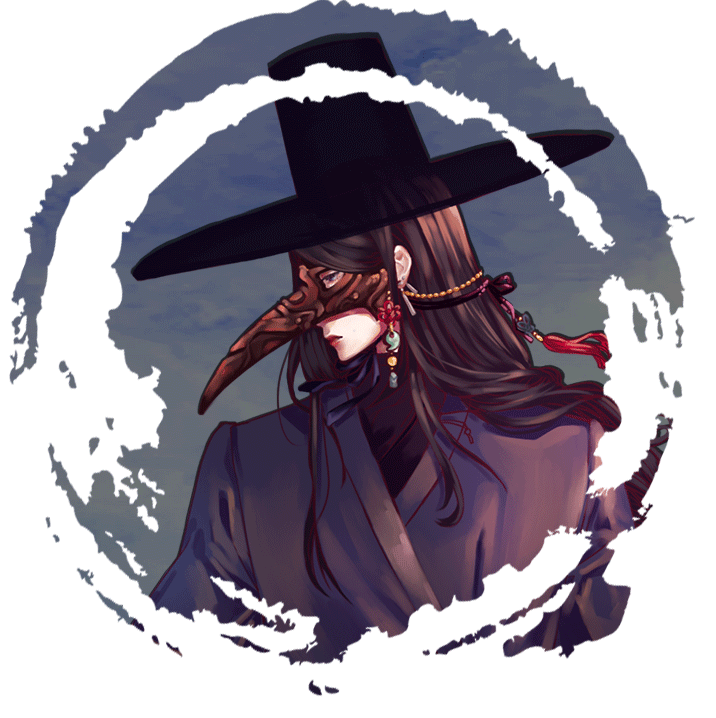
妖怪 | 저승차사
???? 歲
186cm 표준+3

비 형
사자를 인도�하는 저승차사

" 그것 또한 그대의 운명길인 것을 "

:: 외형 ::
죽음의 문턱에서 저울질하다 저승사자를 본 이가 이르기를, 의복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검되 날짐승의 것을 따온 가면 밑으로 창백한 살갖과 붉은 입술만이 형형히 빛났다더라.
사내라 하기에는 넋을 잃을 만큼 고운 선이 놀라워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명부를 꺼내어 뒤적이다 저 멀리서 치는 종과도 같은 기이한 목소리로 아직 명이 남았음을 제게 이르고 바람처럼 모습을 감췄다 하더라.
자신의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양, 그 사내의 온몸은 검은 비단천과 갓으로 빈틈없이 싸매어져 있었다.
인간들의 시간이 흐르고 저승의 차사가 물 건너온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그리 낯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차사는 처음 자신이 걸친 옛 의복만을 걸치고 다녔다. 딱히 별 말이 없는 것을 보면 편한 모양인듯.
새의 부리를 떠올리게 하는 옻칠한 가면 너머로 어둑하게 빛나는 눈은 언뜻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섬뜩하기 짝이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 본 이들은 은은히 반짝이는 자수정같다 묘사하곤 했다.
무신경히, 느슨하게 땋아 놓은 긴 밤빛의 머리카락 끝에는 붉은 댕기가 묶여 나부끼며, 가면 아래로는 창백하리만치 흰 뺨과 마치 석류즙을 짜서 물들인 듯 짙은 붉은빛의 입술이 그 흔한 미소 한 조각없이 단단히 다물려 있다.
그 긴 옷자락을 휘날리며 염라에게 데려갈 영혼을 찾아 다니는 모습이 분명 음산하기 짝이 없음에도, 그 모습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처량한 아름다움이 아주 가끔, 죽은 것이 보이는 인간의 마음마저 빼앗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 이름 ::
비형
:: 요괴 ::
:: 나이 ::
외관상 26세
실제 나이는 세는 것조차 잊은지 아주 오래 되었다.
:: 직업/종족 ::
저승차사
:: 키/ 몸무게 ::
186cm/표준+3

:: 성격 ::
[무뚝뚝한, 냉정한, 충실한, 자신의 사람들에겐 다정한, 정에 약한]
"이 우직한 차사에게 볼 일이 있으십니까."
-일부러인지, 본디 성격이 그런 것인지. 그는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요괴들에게조차 가까이 가서 마냥 친한 체 하기를 꺼렸다.
필요에 의해, 혹은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그제서야 한 박자 늦게 입술을 움직여 대답하곤 했다. 그를 아는 이들은 분명, 그가 저승차사라 더더욱 그런 것이라고 확신한다.
산 것들 중, 죽음의 땅으로 자신을 데려갈 존재를 달가워 할 자는 분명 없을 테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특히 인간에게는 더더욱 정을 주지 않으려 한다. 얼마나 오래 살건, 얼마나 심성이 좋은 이이건
결국 인간의 땅에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전부 평등하기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인간에게 정을 주지 않을 것을 택했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 군말 말고 따라오시오."
타고난 운명이 마치 차사를 할 길인것 마냥, 담담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죽은 자의 이름을 세번 읊는 그의 모습에서 부자연스러움이란 찾기 어려워 보였다.
본디 저승사자되는 자의 일이 고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하나 없이 두 눈으로 명부와 죽은 자를 훑으며 명계로 데려가길 반복한다.
아무 말 없이, 사실은 자신의 일에는 참으로 성실하기 짝이 없는 이였다.
"...당신이란 사람은."
그런 그를 알며 말을 주고받는 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마냥 성격이 모질지 못한 탓이리라.
근본이 인간이었기 때문일까. 그리 흘려내고 밀어냄에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친한 체 하는 요괴들을 결국 곁에 두고야 만다.
자신은 무엇을 해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자신과 가까운 이들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는 상냥함이 아주 조금 더 어려 있었다.
:: 기타 ::
1. 벼슬살이를 하다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한 사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명을 마감한 총명한 젊은이에게, 염라는 긴히 할 일이 있다하며 또 하나의 관직을 하사했다.
2. 곁을 함께하는 물건들.
주머니 하나 없이 온 강산을 누비는 그를 무방비하게 여기지 말 것. 그의 그림자 속은 검, 포승줄, 그리고 사자의 명부로 빈틈이 없다.
3. 좋아하는 것.
자연이 품은 산 것의 아름다움을 참 좋아했다. 실은 차사의 일로 온 강산을 누비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4. 염라와 신주.
공교롭게도 신주의 그 감미로움이 염라의 마음에 쏙 들었던 탓에, 이맘때쯤이면 비형은 아주 잠시 차사의 일을 내려놓고 신주를 얻기 위해 도래샘이 흐르는 마을로 발걸음을 향한다.
술 한병으로 골치아픈 일을 묻어둘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여전히 그에 대한 푸념 따윈 없다.
5. 한 발짝 물러나서는.
발길이 닿으니 인연마저 닿아 서월과 도래의 성격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니, 비형은 그저 물러나서는 둘이 티격태격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실은 저러다 크게 싸움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6. 술에 약한.
술에는 영 젬병이었다. 듣기로는 술판이 시작된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얼굴이 벌개져서는 잠이 든다던가.....
7. 가면.
자신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좀처럼 꺼렸다. 그로 인해 가면을 만지는 것도, 누군가의 손길이 가면 밑 뺨에 닿는 것도 영 꺼리는 모양. 포박당하고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png)






